“서울대에는 순수하게 과학을 좋아하고 실험에 헌신적인 대학원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대의 자산이지요.”
세계적 연구대학 프로젝트 (WCU)를 위해 초빙된 외국인 교수들은 한결같이 서울대 대학원생들의 순수한 열정과 끈기에 감탄했다. 서울대가 세계 47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궁금증과 끈기를 무기로 우직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대 과학도들의 삶을 소개한다.
아무도 본 적 없는 암흑물질을 찾아서
물리학과 최정훈 (박사과정)
 최정훈 학생(33)은 매일 설악산 구룡령의 지하 700m 실험실로 출근해, 실험용 크리스탈에 우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는지 컴퓨터에 찍힌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최정훈 학생(33)은 매일 설악산 구룡령의 지하 700m 실험실로 출근해, 실험용 크리스탈에 우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는지 컴퓨터에 찍힌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알려지지 않은 우주의 ‘암흑물질’을 찾는 거에요. 인간이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 건 1%도 안되고, 시커먼 99%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중에 질량이 있지만 아직은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없는 30%정도를 암흑물질이라고 불러요. 그게 와서 부딪히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에요.”
그가 속한 서울대 ‘암흑물질탐색연구단’은 암흑물질을 찾기 위한 세계의 경쟁에 뛰어 든 선두 그룹 중 하나이다. 이들은 우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입자들을 모두 제거하면 우주의 암흑물질만 남을 것이라는 우직한 가설에 기초해 지구의 입자들이 닿을 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한다. 실험실 선배들은 적절한 공간을 찾아 남극에 가기도 있기도 한다.
“우리 교수님처럼 한국에서 더 좋은 실험실을 짓고 연구를 계속하는 게 꿈이에요. 정말 심심해서 못 견딜 때면 산에 올라서 천체 망원경으로 별똥별도 보고 토성 띠도 세어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눈에 보이는 1%의 우주를 보고 있으면 할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게 생겨요.” 등산객도 드문 산에서 서울대 로고가 찍힌 암흑물질탐색연구단’차를 몰고 가는 그를 바라보는 강원도 사람들의 우문에 대답하는 것도 재미난 여가생활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설레는 순간은 학회에 참석할 때에요. 암흑 물질에 대한 논쟁을 듣고 나면, 세상에 어떤 유명한 과학자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찾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뻐근해 져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그는 10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암흑물질을 제일 먼저 찾아서 노벨상을 받는 거죠.”
실험실 붙박이가 된 그녀
김도희 (약학과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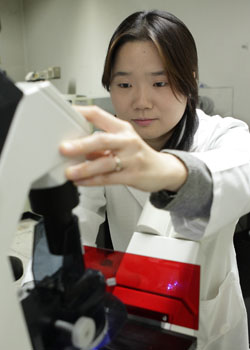 매일 9시 출근. 저녁 6시경까지 실험. 이후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자료를 읽다가 10시쯤 퇴근. 주말에도 다를 바 없는 하루. 명절에도 이하동문.
매일 9시 출근. 저녁 6시경까지 실험. 이후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자료를 읽다가 10시쯤 퇴근. 주말에도 다를 바 없는 하루. 명절에도 이하동문.
박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있는 서른 살 김도희 씨의 일상이다. 그녀는 미국 암학회에서 전도유망한 대학원생에게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 (Scholar Training Award)’을 두 차례나 받았고, 해외 학술지에도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런 일상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지도교수가 자주 들르기 때문이 아니다. 스스로 연구를 해야 하니까 필요한 시간에 실험실에 있는 것뿐이다. 상황은 다른 연구원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김도희 씨의 지도교수는 암예방 신소재 탐색과 그 작용 기전 규명 공로로 한국인 최초로 네이처 리뷰에 초청돼 논문을 발표해 이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서영준 교수. 서 교수는 그저 “실험실 붙박이가 되라”며 붙박이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연구라는 게 중독성이 있어요. 처음에 선배들 실험을 보고 배울 때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익숙해져서 자기 주제를 정해서 하기 시작하면 실험실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져요.”
야식을 함께 먹으며 ‘바깥세상’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실험실 사람들의 여가생활이다. 가끔이라도 친구들을 만나면 ‘딴 세상 여자’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다며 머쓱하게 웃는다.
석사과정 당시 김도희씨는 암을 예방하는 천연물질의 작용기전을 규명하는 실험을 했다. 지금은 염증 유발 물질이 유방암을 악화시키는데 미치는 신호전달기전을 밝히는 게 연구과제다. 이런 실험은 뚜렷한 결과를 관찰하는 데까지 보통 2~3년이 걸린다. 연구과정 자체가 시간과의 싸움인 것이다.
앞으로 제자들에게 엄마처럼 따뜻한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당장은 이해심 많은 사람과 결혼해서 연구를 그만두지 않는 게 계획이다. 암치료 분야에서 ‘전도유망한 과학자’로 선정되었던 사람으로 퍽 소박한 꿈이지만, 이미 실험에 중독된 그녀를 최고의 암 치료 연구자로 만드는 데는 충분할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꿈을 연구하는 곤충 소년
한창석 (생명과학부 석사과정)
 생명과학부 4학년이던 한창석 학생은 관악산에서 잡아온 소금쟁이를 반찬통에 담아 놓고 열두 시간 째 바라보고 있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곤충 채집이 취미였던 그는 유달리 정이 가던 소금쟁이로 졸업논문을 써보려고 하던 차였다. 암수가 함께 있던 상자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생명과학부 4학년이던 한창석 학생은 관악산에서 잡아온 소금쟁이를 반찬통에 담아 놓고 열두 시간 째 바라보고 있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곤충 채집이 취미였던 그는 유달리 정이 가던 소금쟁이로 졸업논문을 써보려고 하던 차였다. 암수가 함께 있던 상자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수컷 소금쟁이가 암컷에게 구애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읽었던 모든 곤충학 책에서 소금쟁이는 암컷의 생식기가 노출된 구조 때문에 강간으로 번식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너무 흥분해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는 관찰일지를 요약해 순식간에 학부 졸업 논문을 완성했고, 대학원에 진학한 후 그 발견에 대해 ‘암컷 생식기의 노출 정도와 수컷 구애 행동 간의 공진화 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을 PLoS one 저널에 발표했다. 석사 학위도 받지 않은 학생이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것은 일대 사건이었다.
“다른 길을 둘러 본 적이 없어서 남들보다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는 여덜 살 때 매미를 손에 잡아 본 이후 ‘곤충소년’이 되었다. 집에 있는 반찬통들을 쓸어다가 소금쟁이, 풍뎅이 따위들을 잡아 놓고 하루 종일 쳐다보았다. 그 시절 덕분에 지금도 몇 시간씩 자리를 못 뜨고 곤충 상자를 들여다보며 일지를 적어야 하는 실험이 힘들지 않다며 웃는다.
고등학교 때 곤충 전문가인 최재천 교수의 강의를 들은 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가야겠다는 동기도 생겼다. 학부 2학년 때부터 대학원생들 연구실에 매일 찾아가 실험을 돕고 세미나에도 꼈다.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도 자연과학계열내에서 전공도 정하지 못한 동기들이 태반이었지만 그는 얼른 대학원에 진학해 실험실에 제 의자 하나를 놓고 싶었다. 2007년 폴란드인인 표트르 야브원스키 교수가 부임해 ‘행동생태 및 진화 연구실’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 제자가 된 것도 그였다. 야브원스키 교수는 그의 학부 논문에서 ‘공진화’라는 가설을 세워 학술논문의 구조를 갖추도록 도와주었다.
“실험 결과가 내 가설과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쾌감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여덟 살 때 광릉 수목원의 곤충 박물관에 갔던 날 이후 최고로 기분 좋은 날이었죠.” 그는 한 동안은 곤충에 취해 있을 듯 하다.
2009. 11. 26
서울대학교 홍보부 조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