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 최종 발표일에 학교를 가득 매운 취재 차량
유전자의 구조를 밝혀낸 지 50년 후인 2003년 4월 인간의 유전정보 전체, 즉 유전체(genome)를 이루는 염기문자 서열이 발표되었다. 46개의 사람 염색체에 담겨 있는 46개의 DNA 분자가 모두 31억 2천만 개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단백질을 지정하는 정보를 가진 유전자의 수는 대략 3만 개 정도라는 추정이 제시되었다. 이 숫자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아니, 단세포인 박테리아도 1만 개에 육박하는 것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고작 3만 개라니. 꼬마선충 벌레도 2만 개이고, 생쥐도 3만 개, 더구나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의 유전자 수가 6만 개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이 3만 개라는 숫자는 정말 자존심을 건드리는 작은 숫자이다.
유전체 정보를 밝힌 일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겸손하게 한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지위에 있으니 그에 걸 맞는 복잡한 유전자를 가져야 하는데, 숫자는 그 기대를 저버린다. 그리고 동물 중 우리와 촌수가 가장 가까운 침팬지와는 99%의 유전자가 같다. 우리의 기대가 어찌됐건 이 3만 개 수준의 유전자는 우리를 수정난 세포 하나에서 거의 100조 개에 이르는 세포로 분화시켜 성인을 만들고, 늙고 병들어 죽는 단계에 이르기 까지 모든 생물학적 과정을 지휘한다. 이 3만 개의 유전자가 어떻게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며 어떻게 환경과 대화하며, 어떻게 적절한 시간과 공간을 맞춰 발현(expression)되는 지를 푸는 것은 post-genome 시대 생물학자들의 과제이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못 말리게 자기중심적이다. 시선을 내게서 밖으로, 주변으로 돌리기가 절망적으로 어렵다. 의식주의 기본 문제를 해결한 인간들의 관심은 안 아프고, 안 늙고, 오래 사는 것에 철저하게 집중되어 있다. 오늘날 선진국의 과학연구는 그 대부분이 바이오 연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과학(醫科學)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불로무병장수를 희구하는 인간의 바람과 정확히 포개진다.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관심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돌아보는데 쓰여 진다. 불로무병장수를 바라는 인간의 바람은 첨단의 진단장비와 신약을 개발하고, 대체 조직과 장기를 개발하는 등 여러 갈래로 추진된다. 그러한 시도의 극단에 인간의 부분을 (또는 전체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단도직입적인 방법이 구사되고 있다. 고장 난 부품을 갈아 끼우며 생명을 연장하는데 구태여 인공 대체품을 쓰는 사이보그가 되기보다는, 천연의 생체 부품으로 바꾸는 것이 더 안심이 되는 법이다. 또 같은 생체 부품이라도 돼지나 염소 같은 다른 동물 보다는 생면부지라도 다른 인가에게서 얻는 생체 부품이 당연히 더 선호된다. 그러나 내가 아닌 남의 생체 부품들은 다 내 몸에서 거부되는 것이 생물의 이치이므로, 거부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부품을 여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바꿔치기를 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이다. 최상의 목적을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속성은 당연히 생명을 늘이기 위하여서라면 나를 복제하여 여분의 부품을 만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섬뜩한 광고 카피의 정신대로, 최상의 방법이 있는데, 왜 차상에 만족하겠는가.
자기 주변의 환경이 파괴되어 다른 생물종들은 멸종이 되어 가더라도, 인간은 “발전”을 위해 “혁신”을 부르짖으며 저 높은 곳을 향한 컨베이어벨트의 속도를 더욱 재촉한다. Homo sapiens가 제 아무리 똑똑한 존재들일지라도, 지구의 생태계에 함께 엮여 있는 생물의 한 種인데, 이 엄연한 사실을 거부한다면 그 대가는 그야말로 끔찍하다. 생물학적 원칙을 최대한 이용하여 스스로의 불멸(immortality)을 꿈꾸는 인간이 자신의 기반인 지구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형국은 아이러니 그 자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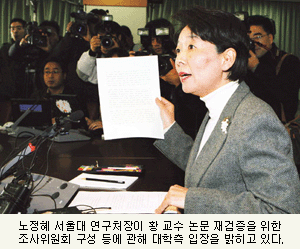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는 가깝게 또는 멀게 그 조상을 공유하고 있는 친척들이다. 모든 생물체의 공통 조상인 최초의 생물체는 약 40억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수 많은 가족 계파를 형성하며 변화하여 오늘의 생물계를 이루게 되었다. 진화(evolution)라고 이름 붙여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종들이 지금 우리 지구의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다. 제한된 자원 때문에 불가피한 생존경쟁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생물들을 걸러내게 되고(natural selection), 이 適者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의 테스트를 통과한 영예의 생존자들이 현재 이 지구상에 남아 있다.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진 인간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진화의 원리를 알아내는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경쟁과 適者생존”으로 요약되어지는 자연선택의 원리를 심하게 오해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자연계의 원리이고, 먹고 먹히는 싸움에 승리하여 남을 밟고 올라간 자가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남은 자가 된다는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다.
지구상에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는 가깝게 또는 멀게 그 조상을 공유하고 있는 친척들이다. 모든 생물체의 공통 조상인 최초의 생물체는 약 40억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수 많은 가족 계파를 형성하며 변화하여 오늘의 생물계를 이루게 되었다. 진화(evolution)라고 이름 붙여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끝까지 살아남은 종들이 지금 우리 지구의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다. 제한된 자원 때문에 불가피한 생존경쟁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생물들을 걸러내게 되고(natural selection), 이 適者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의 테스트를 통과한 영예의 생존자들이 현재 이 지구상에 남아 있다.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진 인간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진화의 원리를 알아내는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경쟁과 適者생존”으로 요약되어지는 자연선택의 원리를 심하게 오해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자연계의 원리이고, 먹고 먹히는 싸움에 승리하여 남을 밟고 올라간 자가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남은 자가 된다는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윈이 제시하고, 많은 생물학자들이 동의하는 適者의 의미는 자기의 자손(또는 유전자)을 후대에 가장 많이 남기는 개체이다. 아무리 잘나고 사회적 성공을 이룬다 해도, 후대에 자손을 남기지 않는 개인은 생물학적인 적응도(fitness)가 제로이다. 요즘 수 많은 헬스클럽들이 피트니스 센터라는 이름으로 성업 중이나, 가장 원천적인 fitness는 환경에, 자연에, 어느만큼 적응하여 자손을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현재 진화하는 인류의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매우 半生物的이다.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고, 자신의 웰빙과 불로장생에만 집중하는 경향은 인간이 자기중심적 시야에 사로잡혀 가장 근원적으로 생물의 한 종임을 망각하면서 벌어지는 부조리 현상이다.
인간은 다른 생물들과 중요한 생물학적 원칙을 대부분 공유한다. 박테리아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유전정보의 암호도 똑같고, 유전정보가 읽히고, 복제되고, 표현되는 과정도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 다세포 생물의 경우 벌레와 곤충으로부터 쥐와 사람에 이르기까지 발생과정의 기본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생물의 통일성(unity)으로 불리는 이 현상은 비단 분자나 개체 수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집단과 사회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환경과 대화하며 변해가는 진화의 양상에서도 이 통일성은 놀랍게 적용된다. 다양성(diversity) 속의 통일성으로 불리는 이 현상은 모든 생물체가 같은 뿌리에서 연유하였다는 생각을 더욱 뒷받침한다. 이런 통일성 때문에 벌레에서 발견한 생물학적 원리가 사람의 질병치료에 이용되고,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한다. 같은 생물로서 이렇게 다른 생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인간이, 아니 가장 철저히 다른 생물들을 이용하며 반성하고 있는 인간이, 자신의 기반인 생물계의 기본원칙들을 망각해 가고 있다는 것은 모순의 덫에 걸린 형국이다.
다시 숫자로 돌아가 보자. 3만 개 밖에 안 되는 유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복잡성을 가진 인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구와 우주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떻게 작동되며 또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알고 있는 인간. 언어와 도구를 만들어 발전시키며, 눈에 보이는 대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현상과 초월적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인간. 분명 숫자는 한계가 있다. 키와 연봉과 지능지수가 훌륭한 인간됨을 보장해 주지 않듯이.. 그러나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지점에 새로운 차원의 질적 도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자 과제이다.
계간 [자연대 이야기] 3호 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