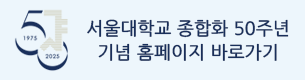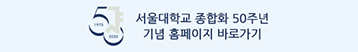페이지 안내
연구
연구성과
연구성과
연구성과 미리보기

무아레 격자 중첩 통해 2차원 양자물질 플랫폼 구현
재료공학부 유효빈 교수 연구팀
재료공학부 유효빈 교수 공동연구팀이 무아레 격자 중첩을 통한 2차원 양자물질 플랫폼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연구성과 게시판

서울대병원 권준수 교수, 정신분열병 조기진단 기술 개발
서울대병원 권준수 교수, 정신분열병 조기진단 기술 개발서울대병원 권준수 교수가 정신분열병 발병 가능성을 미리 알아냄으로써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권준수 교수팀은 신경외과 뇌자도센터 정천기 교수팀과 공동으로 최첨단 뇌 검사기기인 뇌자도(腦磁道·MEG· magnetoencephalography)를 이용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상인18명과 고위험군 16명 등 34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정신분열병 고위험군의 청각 기억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저하되어 있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고위험군은 현재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이 없더라도...

재료공학부 박수영 교수, 세계 최초로 흰빛을 내는 OLED 형광 분자, ‘분자 전구’ 개발
재료공학부 박수영 교수, 세계 최초로 흰빛을 내는 OLED 형광 분자, ‘분자 전구’ 개발요즘 휴대전화와 MP3플레이어의 화면으로 흔히 사용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발광 물질이다. 액정디스플레이(LCD)와 달리 별도 광원(光源)이 필요 없어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조명 분야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보통 형광물질은 분자 모양에 따라 독특한 색을 내지만 그 자체로 흰빛을 내는 분자는 아직까지 없었다. 현재는 빛의 삼원색인 빨간색 녹색 파란색 빛을 내는 물질을 섞어 흰빛을 만들어 내지만 제조 공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박수영 ...

의과대학 김웅한 교수, 2주 아기 무수혈 심장 수술
의과대학 김웅한 교수, 2주 아기 무수혈 심장 수술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김웅한 교수가. 생후 2주된 아기를 무수혈 수술 (저장혈을 사용하지 않는 수술)로 심장 기형을 수술하는데 성공했다. 김웅한 교수팀은 대동맥 축착증 및 대동맥궁의 저형성증, 심방 중격 결손증과 동맥관 개존증을 앓고 있던 아기에게 6시간 동안 무수혈 수술을 시행하였다. 선천성 심질환인 대동맥 축착증은 선천적으로 대동맥이 좁아져서 대동맥과 폐동맥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증상이다. 신생아의 동맥관이 막히면 환아가 즉시 사망하기 때문에 대부분 생후 1개월 이내에 수술해야 하는 위험한 질환이다. 대부분의 대...

경제학부 김태훈 학생, 경제논문대상 수상
경제학부 김태훈 학생, 경제논문대상 수상경제학부 김태훈 학생 (대학원과정)이 '해고의 신호효과에 대한 실증분석과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한국경제학회가 선정하는 경제논문상을 받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근로자들이 해고된 뒤 재취업할 때 임금 등에서 큰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사태도 노동자들이 해고로 인해 임금 손실이 클 것을 우려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해고라는 것이 근로자들과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태훈 학생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노동시장을 ...

서정선 교수, 한국인 유전정보 담은 게놈지도 완성, 네이처지에 게제
한국인 유전정보 담은 게놈지도 완성, 네이처지에 게제서울대 의과대학 유전체의학연구소 서정선 교수는 한국인 남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완성해 네이처지에 발표했다. 연구를 주도한 서정선 교수는 7월 8일 내외신 기자들이 자리를 빽빽이 채운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 세계 주요 4개 인종에 대한 게놈정보를 완성인간 유전체 전장서열분석에 대한 논문은 모두 지난해인 2008년에 발표되었으며, 첫 번째는 제임스 왓슨(James Watson) 박사, 두 번째 논문은 익명의 중국인 한족 남자, 세 번째 논문은 익명의 아프리카인 남자에 대한 유전체 분석 ...

인류학과 박순영 교수, 출생계절과 키의 상관법칙 연구
인류학과 박순영 교수, 출생계절과 키의 상관법칙 연구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박순영 교수팀은 출생한 계절에 따라 성장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 남북한 간에 반대로 태어난다는 연구결과를 확보하고 ‘출생 계절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북한 차이 연구’라는 제목으로 ‘인류생물학 연대기’(Annals of Human Biology)에 게재했다. 박순영 교수팀은 북한의 기아가 심각했던 1990년대와 그 전후를 삼분해 출생 계절과 신장 발육 간 연계성을 조사한 결과, 1990년대 태어난 북한 청소년만 전세계의 일반적인 통칙(通則)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

농생명공학부 조종수 교수,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농업생명대학 농생명공학부 조종수 교수가 대한민국학술원상의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학술원상은 1955년부터 매년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부문에서 학술 연구 또는 저작이 우수해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자를 선정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5천만원을 수여한다. 2009. 7. 1서울대학교 연구처

식물병원, 출간
서울대 식물병원은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에 자라는 수목의 병과 해충, 생리적 피해를 망라한 ‘조경수 병해충 도감’을 출간했다. 578 페이지 분량의 도감에 실린 병해충은 전염성 병원균 105종과 해충 123종, 생리적 피해(비전염성 병) 45종 등 우리나라 수목의 대표적 병해 273종이다.

독어독문과 전영애 교수, 괴테시 완역 발간
독어독문학과 전영애 교수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1749~1832)의 시 전편을 완역해 <괴테 시 전집>을 출간하였다. 1994년에 시작해 매주 여러 교수들이 참여하는 '괴테독회'를 통해 번역을 시작해 완역까지 무려 15년이 걸린 노작이다. 수록된 시는 모두 770편으로, 괴테가 7세 때 쓴 할아버지에 대한 문안시, 슈베르트의 가곡으로 유명한 '들장미', 팔순을 눈앞에 둔 1828년에 쓴 '떠오르는 보름달' 까지 괴테가 전 생애에 걸쳐 쓴 시를 아우르고 있다. <괴테 시 전집>은 이를 초기시, 질풍노도, 장년기 초기의...

이주형 교수팀, 구법승 연구자료 저서로 발간
고고미술사학과 이주형 교수 연구팀은 '구법승'들에 대한 3년간의 연구 결과를 모아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 을 발간하였다. 구법승(求法僧)이란 인도로 직접 떠나 붓다의 유적을 참배하던 승려들을 말한다. 3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 많은 동아시아 승려들이 불교 발상지인 인도로 떠났고, 문헌에 이름이 알려진 구법승만 적어도 165명이다. 현장·법현 등 중국 승려들이 대부분이지만 혜초 등 고구려·백제·신라 승려들과 일본 승려도 있었다. 이들 구법승은 불교사나 동서교류사뿐 아니라 불교미술사 연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의 인도 방문이 경전과...

서유헌교수, 강석진 교수,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의과대학 서유헌 교수와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가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3억원이 수여되었다.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는 표현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리(Lie) 대수학’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영 월(Young wall)’ 이라는 독창적인 수학이론 모델을 창안했다. 의과대학 서유헌 교수는 새로운 치매 원인 물질을 알아내는 등 뇌 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그는 치매를 유하는 물질로 뇌 속에 있는 작은 단백질의 일종인 ‘베타펩티드’보다는 다른 단백질인 ‘C단...

서울대박물관, 올해의 우수활동상 수상
서울대학교박물관(관장 송기호)은 2009년 5월 25일자로 한국박물관개관 100주년을 맞아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제정한 제1회 <한국박물관·미술관 올해의 우수활동상 -기획전시 부문->을 수상하였다.이 상은 국내 국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미술관이 2008년에 실시한 기획전시 중 가장 우수한 전시를 선정하여 수상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박물관은 2008년 하반기에 <몽골, 초원에 핀 고대문화> 특별전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몽골 국립박물관 및 고고학연구소의 협조로 청동기시대 및 초기철기시대 유물을 중심으로 해당 전시를 개...